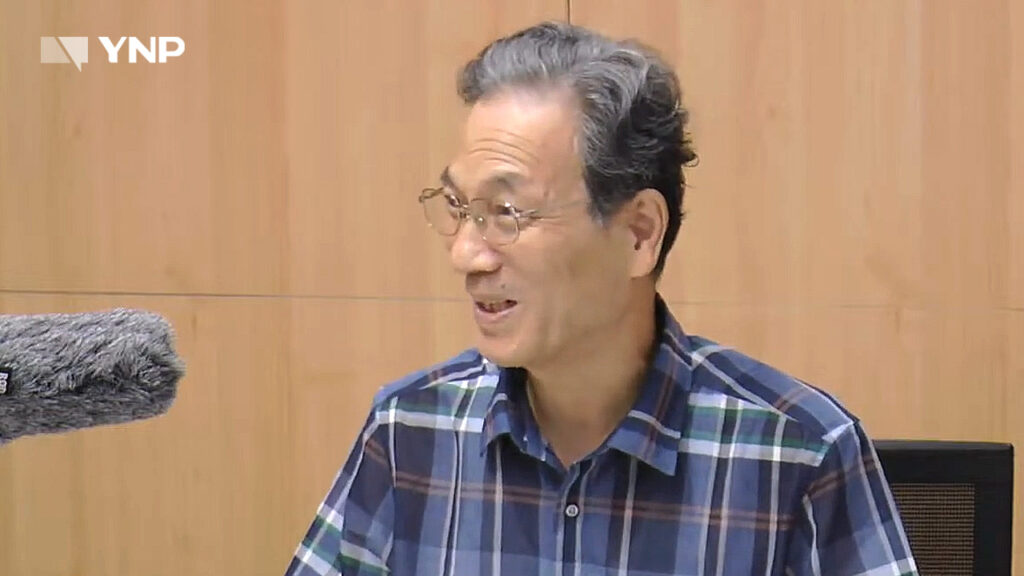
[앵커]
문해력 논란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기 위해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원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.
어서 오세요.
[ 정원수 /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]
네, 안녕하세요.
[앵커]
청소년 문해력 문제 해결책을 언어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, 특히 한자교육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한자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
[ 정원수 /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]
저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반드시 한자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말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쉬운 글자부터 해서 한자교육을 시키고 한자어 교육도 같이 시키고. 또 한문까지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어 지식을 많이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한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.
[앵커]
교육 현장에서는 한자교육이 추가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[ 정원수 /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]
물론 한글만 가르치고 한글로 된 책을 읽고 하면 좋겠죠. 그러나 한자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들은 그 문자를 한자로 쓰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한자를 가르치거든요.
우리도 옛날에 서당식 교육을 했고 과거에는 한자를 가르쳤습니다. 그러니까 한자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자교육을 시키면서 중국어라든가 일본어까지도 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일거양득입니다.
[앵커]
부정적인 얘기로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한자교육을 기본화하게 되면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고등학생들에겐 제2외국어 그중에서도 환자와 관련이 있는 중국, 일본 언어를 배우기도 쉽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
[ 정원수 /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]
맞습니다. 우리말은 사실상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, 우리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일본으로부터 식민통치를 당했잖아요. 그리고 일본(으로부터) 해방이 되고 또 6.25 전쟁을 거치고. 우리가 현대 교육이, 공교육이 제대로 시작된 때가 거의 70년대부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우리는 한자교육을 잘 안 시켰는데 우리말의 상당한 부분이 일본 식민통치 시절부터,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일본식 한자들이 우리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한자교육을 꼭 시키고. 오히려 일본어와 중국까지도 잘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.
[앵커]
알겠습니다. 리포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. 보셨다시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을 두고 이른바 문해력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젊은층의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
[ 정원수 /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]
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모들이 바라보는 면도 있고, 또 일반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고요. 그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어휘력을 얘기하는 것이고, 어휘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어는 고유어, 한자어, 외래어, 이렇게 구성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한자어들에 대한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문해력 하면 자기 모국어의 그 어휘력을 잘 키워서 문장을 잘 해석하고 하는 것이니까 독서를 또 많이 해야 하고요.
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해력을 높여줘야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이 또 있습니다. 신조어, 일상생활에 필요하죠. 그러한 말들도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죠.
[앵커]
알겠습니다. 교수님께서는 대학교수이신만큼 다양한 세대를 만나 소통하고 계실 텐데요. 젊은층과 기성세대 사이의 소통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. 이런 거는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십니까?
[ 정원수 /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]
조금 전에 내가 신조어 얘기를 했었는데요.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이렇게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. 저도 이 신조어들을 잘 몰라요. 기성세대 입장에서 내가 청소년들,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것은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지는 신조어 같은 경우를 모르니까 기성세대들은 그런 말을 쓰는 자기 자녀 세대들,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.
제가 몇 개 단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. 그 ‘얼죽아’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‘얼죽아’라는 말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, ‘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’ 그런 얘기를 합니다. ‘얼’ 자고 ‘죽’ 자고 ‘아’ 자고. 그다음에 ‘삼귀다’라는 말을 하는데 ‘삼귀다’란 말은 뭐냐면, 그 썸타는 단계에 ‘사귀다’ 사 자를 그 숫자 4에 빗대서 4가 되기 전에 3. 이렇게 해서 4귀다 이전이니까 3이잖아요. 그렇게 해서 ‘삼귀다’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
이런 식의 말들, ‘고답이’ 이런 말, ‘고구마 잔뜩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’, 이런 사람을 일컬을 때 ‘고답이’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. 이런 신조어들 같은 경우도 세대차를 가지고 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말들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합니다.
[앵커]
일각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문해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. 교육부에서도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문해 능력이 높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.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?
[ 정원수 /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]
그런 시각으로.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한국인들의 전체적인 실력이라 할까, 문해력이나 이런 면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. 어려서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익혀서 수십 권,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상당히 지식으로 무장하면서 초등학교 과정, 중학교·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했기 때문에.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.
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아주 자랑스러운 민족으로서, 훌륭한 그 지식을 갖춘 그런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게 본다면 뭐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, 이런 측면이 한 나라의 그 민족,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식 수준을 이렇게 낮추고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.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저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,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.
그런 면에서 문해력 얘기를 했지만 더 좋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자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다른 외국어들,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독일어, 이런 다중 언어 과목 실력도 갖출 필요가 있다, 이런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.
[앵커]
오늘 좋은 말씀 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원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
※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•언론사: YNP
•진행: 이연관 (<청소년 뉴스 LIVE> 진행자)
•출연: 정원수 (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)
•방송일: 2024년 8월 3일(토) 14시 00분~
이연관 청소년기자 @ynp.or.kr
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만드는 ‘청소년 뉴스 LIVE’ 리포트입니다.
